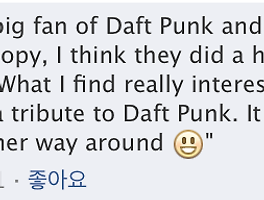5월에 있을 존 메이어의 첫 내한 공연 티켓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전에 한번 생각해본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다.
그 내용은 존 메이어가 쌓아온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도 어느 정도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존 메이어의 시작은 도시적이었고, 젊음과 멋짐이 뿜어져 나오는 전형적인 팝밴드에 가까웠다. 밴드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 건 LA메탈에서의 본조비와 흡사하다. 남성적인 매력이 뿜어져나오는 외모에 건장한 체격으로 통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 자체로 많은 소녀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음악적 기반도 처음부터 블루스와 컨트리가 아니었다. 초기 앨범 'Rooms for squares'를 들어보면 (물론 음악의 기반도 블루스풍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어쿠스틱 기타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팝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대중 친화적인 외모와 음악을 기반으로 존 메이어는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고, 자신의 음악적 지지기반은 물론이고, 경제적 기반도 먼저 이룩해놓았다. 그중 소녀팬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을 확보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인 블루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시작은 두 번째 앨범인 'Heavier things'다. 데뷔작과 다르게 좀 더 블루스를 차용했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더 강하게 집어넣었다. 그리고 드디어 2006년에 'Continuum'에서 자신의 블루스를 완성한다. BB킹, 버디 가이 그리고 에릭 클립튼과의 협업이라는 배경 속에서 자신의 실력은 물론이고 블루스 장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의 블루스적 도전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음악시장에서 블루스가 아직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다.
이제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존 메이어가 블루스라는 장르를 데뷔 이후에 갑작스런 관심을 가지고 음악의 노선을 바꾸는 도전을 했을까? 애초에는 경쾌한 팝으로 소녀팬들을 사랑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
정답을 말하자면, 그는 애초에 블루스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는 13세 때부터 스티비 레이 본를 보면서 블루스에 대한 꿈을 가져왔고, 기타에 매진 하느라 청소년기에 정신병원에도 수 차례 들락나락했었다.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서 그가 선택한 것은 블루스보다 더 쉽게 대중친화적인 음악을 '먼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잘하는 음악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는 등 기반을 마련해놓고 자신의 자서전 본론을 그 이후에 써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2005년엔 드럼과 베이스에 각각 스티브조던과 피노 팔라디노를 데려와 John Mayer Trio를 결성하여 수준급 블루스를 시도했다.
소녀팬들도 2006년 Continuum 앨범으로 본격적인 블루스 색을 띄는 존 메이어를 버리지 않았다. 상업적으로나 현대 블루스의 계승으로 존 메이어를 나무랄 곳이 없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의 도전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적었다. 그의 실력이란 부분은 학업적 기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는 열정까지 탄탄했음이 확실했고, 대중의 관심과 인기라는 운과 기회의 영역에서도 이미 달성해놨기 때문이다. 그의 커리어 전략은 여지없이 맞아 들었고 그는 지금 시대를 이끄는 싱어송라이터다.
존메이어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훌륭한 표본이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하여 좋은 기반을 형성한 후 적절한 시기에 노선을 후자로 변경함으로서, 진로결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양단의 치명적인 단점을 상호보완하는 쩌는 놈이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의 선택에서 고민하고 있다. 모든 인생사에 정답이 없듯 어떤 선택이 현명하고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어렵겠다. 하지만 존 메이어가 선택한 길은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괜찮은 참고 사항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가사는 여전히 소녀팬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한 달달한 사랑이야기가 대다수다. 어쿠스틱 기타를 메고 사랑을 흥얼거리는 존 메이어의 목소리는 블루스를 시작한 이후 전자기타를 든 모습에서도, 그리고 다시 컨트리 음악을 위해 들었던 기타를 다시 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매력적이다.